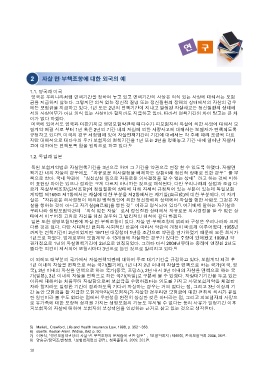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P. 18
구
2 자살 면·부책조항에 대한 외국의 예
1.1. 영국과 미국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면책기간을 정하여 놓고 있고 면책기간의 자살은 의식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식 없는 정신적 질병 또는 정신질환의 장해의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또는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고 발생된 자살사고는 정신질환의 상태에
서의 자살여부가 아닌 의식 있는 자살이라 할지라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면책기간의 차이 말고는 큰 차
이가 없다 하겠다.
미국에 있어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약관의 대다수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 보
험계약 체결 시로 부터 1년 혹은 2년의 기간 내의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5). 미국의 경우 제정법에 있어 자살면책기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각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
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주가 보험자의 면책기간을 1년 또는 2년을 정해놓고 기간 내에 일어난 자살사
고에 대하여는 면책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6)
1.2. 독일과 일본
독일 보험계약법은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약관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살면
책기간 내의 자살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하는 상황아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우”를 부
책으로 한다. 국내 약관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에 비하
여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법과 조금 다
르게 자살부책조항(단서조항)에 정실질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보험
계약법 제169조 제1항에서는 자살에 대한 부분을 제2항에서는 자기살(自己殺)에 대한 부분이다. 이 자기
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외된 병적원인에 의한 정신장해의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사람도 그것은 자
살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살(自己殺)을 행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7).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살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약관의 ‘의식 없는 자살’로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이루어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그 법리적인 해석이 같다 하겠다.
일본 또한 생명보험약관에 자살 면·부책조항이 있다. 자살 면·부책조항의 법리와 구성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다만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반응에 따라서 약관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1955년
까지는 면책기간이 2년이었지만 1971년 대장성이 1년을 조건으로 약관을 인가하였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1년으로 하였다. 업계로부터 보험계약 후 13개월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1999년 약
관개정으로 1년의 자살면책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다 다시 2004년부터는 종래에 연장된 2년도
짧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험사마다 3년으로 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이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면책약관에 대하여 주로 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의 자살을 면책으로 하는 국가(벨기에), 1년 내지 2년 이내의 자살을 면책으로 하는 국가(미국, 영
국), 2년 이내의 자살을 면책으로 하는 국가(중국, 프랑스), 2년 내지 3년 이내의 자살을 면책으로 하는 국
가(일본), 3년 이내의 자살을 면책으로 하는 국가(독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자살대기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살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다려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3년 이상의 기
간 동안 보험금을 잘 지급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유일
한 원인이라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우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보험자의 사망으
로 유가족에 대한 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생명보험의 기능도 무시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가 일정기간 이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MurielL. Crawford, Life and Health Insurance Law, 1998, p. 352∼353.
6) obertE. Keeton-AlanI. Widiss, Ibid, p. 50.
7)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36면.
8) 양승규/장덕조/한창희, 「보험법개정의 관점」, 청목출판사, 2009, 201면.
18